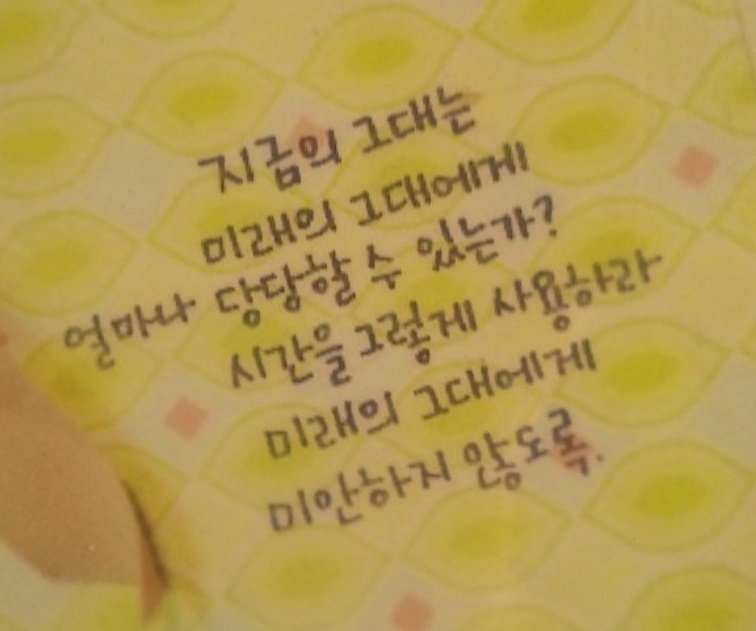명태
고종때 영의정을 진내 이유원이 1871년 쓴 임하필기에서 명태(明太)의 어원이 함경도 명천(明川)에 사는 태(太)씨 어부가 잡았다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태씨가 우리에겐 좀 생소할 수도 있으나 2016년 탈북하여 현 국회위원인 태영호도 명천이 고향으로 명천 일대는 예로부터 태씨가 많은 지역입니다.
태(太)씨는 발해 고왕 대조영(大祚榮)을 시조로 하는 한국의 성씨이다. 대(大)씨와 태(太)씨의 시조는 발해를 세운 대조영의 아버지 대중상이다. 대씨가 태씨로 바뀐 연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후손들이 고려에 망명 하면서 대씨와 뜻이같은 태씨로 성을 바꾼 것이며, 임하일기를 쓴 이유원은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양 아버지.
△생태: 명태를 어획한 상태에서 냉장시켜 시장에 유통시킨 명태
△동태(동명태) : 북태평양에서 잡힌 명태를 얼려 국내에 반입함
△대태 : 가장 큰 명태(보통 상자당 20마리 내외의 체장이 큰 상품)
△중태 : 중간 크기의 명태(상자당 25~30마리 내외의 중품)
△ 소태 : 체장이 작은 소형으로 상자 당 40마리 이상 들어있는 것
△앵치 : 크기가 작은 새끼명태(치어)로 최하품
△꺽태 : 산란을 한 명태가 살이 별로 없어 뼈만 남은 것
동해에서 오징어가 사라진 이유
매년 가을이면 동해 해안가에서 장관을 연출하던 오징어 말리는 모습을 올해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최근 동해안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오징어를 찾기 쉽지 않아 '금(金)징어'라고 불린다. 오징어 성수기인 가을에 한반도 주변에서 오징어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 따르면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2008년 2만5,378톤에서 2009년 2만4,921톤, 지난해에는 1만6,705톤으로 매년 줄고 있다. 2011년에도 하루 어획량이 1,000톤을 밑돌아 예년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오징어가 북상 후 남하하는 회유성 어종인 데서 기인합니다. 오징어는 4~6월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성장하고, 7~9월은 동해 러시아 근해인 북한 해역에 머물다가 10월부터 다시 동해안을 거쳐 남하합니다.
첫번째, 동해 수온 하락
오징어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수온이 평년에 비해 3도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저수온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라니냐'현상으로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자취를 감춘 것이다. 오징어는 회유성 어종으로 남해에서 산란 후 4월부터 동해로 북상해 울릉도를 거쳐 북한, 러시아 연안까지 올라갔다가 9~10월쯤 다시 동해안으로 남하해 9월 말부터 이듬해 2월인 겨울철까지 성어기를 맞는다. 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전 세계 해양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왜 한반도 주변에서는 저수온 현상이 빚어진 것일까.
두번째, 북한내 중국 어선의 오징어 싹슬이
중국은 2010년부터 5년간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를 잡는 '제2차 북중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북한과 중국이 동해 북한 수역 조업약정을 맺어 올해 북한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은 1600척을 넘겼으며 이 어선들이 오징어가 남쪽으로 내려올 틈도 없이 치어까지 낚아가 국내 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에서 대형 어선을 동원해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어선들은 튀김요리용으로 선호도가 높은 작은 크기의 오징어까지 마구잡이로 포획해 씨가 마르고 있다.
오징어 어획량이 중국배들이 북한수역 내에 진출하고 난 이후로 점차적으로 감소해서 2005년도에 비례했을 때 약 한 84%가 감소된 어획량을 보였고요.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어획량을 보게 되면 1900톤 정도밖에 못한 실정입니다. 오징어는 불빛을 보고 몰려오는 주광성이니까 우리나라는 불빛을 적정수치만큼 켜서 잡으라고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불빛을 14만 킬로와트(Kw)로 켜면 중국 어선들은 보통 120만 킬로와트 정도를 켭니다.
라니냐 (반엘니뇨)
-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화되면서 차가운 해수 용승이 더욱 발달하여 적도 동태평양 해역(4°S~4°N, 150°W~90°W) 수온이 정상적인 해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제2차 북중 어업협정
- 2010년에 체결된 '제2차 북중 어업 협정'으로 중국이 2010년부터 5년간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를 잡는 중국어선은 2010년 642척에서 2014년 1887척까지 늘어났다. 공유자원과 관련된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형성하고 보존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1박2일 신년특별기획 2탄 '그 많던 오징어는 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징어 위판량이 10년 전에 비해 75퍼센트가 감소했다는 말과 함께 "직접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나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박2일 신년특별기획 2탄 '그 많던 오징어는 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동해에서 명태가 사라진 이유
1. 바닷물 온도 상승이 꼽힌다. 명태는 수심 3백에서 6백미터 사이의 깊은 바다에 주로 서식한다.
2. 체장 30센티 미만 어린 명태인 노가리를 과도하게 잡아 올린 것도 국내산 명태의 씨를 말린 원인으로 보고 있다.
3. 잡은 명태의 91%가 '노가리', 저인망으로 씨 말려.
동해에서 오징어가 사라진 이유
1. 첫번째, 동해 수온 하락
- 오징어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수온이 평년에 비해 3도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2. 두번째, 북한내 중국 어선의 오징어 싹슬이
- 중국은 2010년부터 5년간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를 잡는 '제2차 북중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명태가 우리 바다에서 사라진 2008년 이후 한국은 해마다 22만톤(t) 안팎의 명태를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죽은 명태에서 얻은 알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새끼 9만4000마리를 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75일만에 모두 폐사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실패를 거듭한 끝에 이듬해 1월, 알을 밴 채 살아있는 명태 1마리를 확보했습니다.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연구진은 이 명태에서 알을 얻어 그해 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명태 수정란 53만개를 확보해 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세대 인공명태’의 탄생입니다.
20㎝ 정도로 자란 1세대 인공명태 가운데 1만5000마리를 연구진은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 방류하고, 특별히 선발한 200마리는 산란이 가능한 어미(35㎝ 이상)로 키웠습니다. 이 중 7마리가 2016년 9월 산란에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명태 완전양식에 성공한 것입니다.
인공명태 생산에 성공한 해수부는 동해 앞바다에 명태를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1만5000마리, 2016년 1000마리를 방류했고, 지난해엔 완전양식으로 생산된 명태 3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생사가 확인된 방류 개체는 3마리에 불과하다고...?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이후 약 31만6000마리가 방류됐지만 지금까지 생사가 확인된 방류 개체는 3마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2016년부터 연근해에서 잡은 명태 1701마리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방류한 30만 마리는 이제 겨우 25㎝ 정도까지 자랐습니다. 아직 27㎝가 되지 않아 조업 금지 대상입니다. 지난해 방류한 30만 마리는 어민들이 잡을 수 있는 크기로 자라지 않은 만큼 실제로는 2016년 이전에 방류한 1만6000마리 가운데 3마리가 확인된 셈이라는 겁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600만 마리 등 지금까지 뚝지 종자 230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출처: 한계려(www.hani.co.kr)
www.youtube.com/watch?v=9Z8PgVhClnE
www.youtube.com/watch?v=9Z8PgVhClnE
"어민들 웃음꽃 폈죠" 180척 어선마다 오징어 한가득 / SBS
#SBS뉴스 #SBSNEWS #SBS_NEWS
<앵커>
한때 오징어가 안 잡혀서 일명 금징어로 불렸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 강원도 동해안은 모처럼 오징어가 가득 잡힌다고 합니다.
조재근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기자>
밤새 조업에 나섰던 어선들이 아침이 되면서 하나 둘 항구로 돌아옵니다.
어선의 어창마다 오징어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징어 금어기가 지난달 풀렸는데 이달 초부터 어획량이 크게 늘면서 강원도에서만 하루 평균 180여 척의 어선이 오징어를 잡고 있습니다.
[윤국진/오징어 채낚기 선장 : 지금 어민들이 전부 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잖아요. (오랜만이죠?) 예, 그렇죠. 오랜만이죠.]
지난 3주 동안 강원 동해안에서 잡힌 오징어는 943톤으로 지난해보다는 4배, 최근 4년 평균보다는 2배 넘게 잡혔습니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SNS은 시간 낭비(Seriously, it is waste of time)다 (0) | 2015.02.06 |
|---|---|
| 2014년 서울대 가장 많이 보낸 학교 (0) | 2015.02.04 |
| 2015년 설날 귀성길 기차표 예매 (0) | 2015.01.13 |
|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에 자살은 없어 (0) | 2015.01.09 |
| 한국어 순화어 (0) | 2015.01.05 |